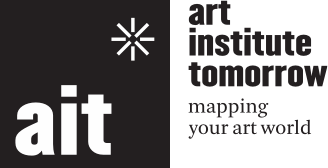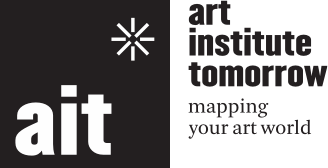■ `0.1초의 승부사` 미술품 경매사
# 1 "전화와 현장 경합이 치열합니다. 6억5000만원을 두 분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세 번 호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6억6000만원입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6억6000만원입니다." 2013년 12월 8일 서울 평창동 서울옥션 경매장. 김현희 경매사가 `따당` 하고 망치를 두드리자 경매장에는 큰 박수가 쏟아졌다. 21번 경합 끝에 이대원 작품 `농원(90×194㎝)`은 전화 응찰자에게 돌아갔다.
# 2 "520. 540. 560. 더 이상 안 하면 540에 마무리합니다. 540만원. 123번. 전화 손님께 540만원에 낙찰됐습니다."지난 12일 서울 신사동 K옥션 경매장. 전두환 전 대통령 `휘호`는 열띤 경합 끝에 540만원에 팔렸다. 추정가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전재국(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컬렉션`은 이날 완판 신화를 이어가며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3개월간 `전두환 컬렉션` 경매가 세간의 관심 속에 치러지면서 단상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autioneer)`란 직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매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이 바로 해당 작품이 팔려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로 낙찰가는 `해머(hammerㆍ망치) 프라이스(price)`다.
호가를 얼마나 올릴지는 경매사 재량이다. 다만 회사마다 규칙이 있는데, 서울옥션에서는 100만원대면 10만원씩 호가를 높여 부르고, 500만원이면 30만원씩, 1000만원이면 50만원씩 높인다. 1억원을 넘어서면 500만원씩 가격이 뛴다.
경매사 일은 무대에서 현장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경매 기획부터 작품 수급과 선정, 자문위원단 감정 의뢰, 도록 제작, 전시 등을 거쳐 경매로 이어지는 과정에 모두 관여한다. 낙찰된 이후에는 판매된 작품과 유찰된 작품을 각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작업까지 해야 끝난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1억4240만달러(1528억원)에 낙찰된 프랜 시스 베이컨의 1969년 작품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
경매사는 미술 경매의 꽃이다. 경매사 역량에 따라 1억원에 팔릴 작품도 1억5000만원에 팔릴 수 있다. 분위기를 띄우고 경합을 붙여 좋은 작품을 가장 비싸게 파는 것이 모든 경매사의 전략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0.1초도 놓치지 않는 승부사이자 심리전의 명수다.
참가자들 눈빛과 자세, 표정만 보더라도 그들이 경합에 얼마나 따라올지 동물적으로 알아챈다. 고객이 패들(응찰팻말)을 내려놓고 비스듬히 앉아 있으면 소극적이라는 뜻.
한 베테랑 경매사는 "일부러 참가자를 무시하는 제스처로 그의 화를 돋우어 열받아서 참여하도록 한다"며 "누가 팻말을 드느냐에 따라 기다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국내에 전문 경매사가 나온 것이 1998년 서울옥션이 생기면서부터다. 국내 양대 메이저 경매사인 서울옥션과 K옥션은 각각 2명씩 경매사를 두고 있으며 다른 경매업체까지 포함하면 현역에서 활동하는 경매사는 10명 안팎이다. 유독 젊은 여성 경매사가 많은 것이 한국만의 특징이다.
국내 1호 미술품 경매사인 박혜경 에이트 인스티튜트 대표는 "경매사가 현장에서 쓰는 말은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000만원 나왔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등 많아야 열 마디 정도다. 평균 두 시간에 200~300점을 진행하는데 그 작품을 매번 똑같은 말과 톤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2시간을 관객들이 초집중하는 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정확한 발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상, 신뢰를 주는 외모, 상황 판단 능력도 경매사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 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미술에 대한 지식과 안목이다.
김순응 전 K옥션 사장은 "작품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배우나 아나운서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경매사는 작품과 시장, 고객에 대해 알면 알수록 유리한 위치다. 그래야만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순발력도 필수다. 박혜경 대표는 "2009년 미술시장이 어려워 경매사 원고 한 페이지에 있는 작품이 줄줄이 팔리지 않고 유찰된 적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전화 응찰을 받다가 전화가 끊기는 돌발 상황도 있고, 낙찰이 되려던 순간 손님이 손사래를 칠 때도 있었다.
따라서 미술 경매에서는 작품번호 1번부터 10번까지는 무난히 낙찰될 수 있는 작품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경매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도 미술시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김순응 전 K옥션 대표는 "2001년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경매장에 나온 사람이 채 20명도 되지 않았다"며 "시장이 호황이던 2007년에는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매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경매 저변이 확대됐음에도 경매장에 나오는 인원은 200~300명이다. 전화와 서면 응찰이 오히려 더 활발하기 때문.
어떻게 하면 경매사가 되는 걸까. 일단 경매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미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필수. 소더비나 크리스티 역시 자체적으로 경매사 육성 커리큘럼을 두고 스타를 골라낸다. 국내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경매사는 학부는 역사나 신문방송학과 경영학으로 다양하지만 대학원에서 예술기획 등을 따로 전공했다.
■ 스타 경매사는 영국식 영어를 쓴다는데…

왼쪽부터 유시 필카넨(크리스티) 토비어스 마이어(前소더비) 크리스토퍼 버지(크리스티)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신기록이 탄생했다. 영국 표현주의 화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1969년 작품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가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1억4240만달러(1528억원)에 낙찰됐다. 이때 경쾌하게 해머(망치)를 두드린 이가 크리스티 간판 경매사 유시 필카넨.
소더비에서 기록한 종전 최고가인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를 제압하며 소더비의 스타 경매사 토비어스 마이어의 자존심을 짓뭉갰다. 토비어스 마이어는 이 때문인지 지난해 말 소더비를 떠나며 세간을 놀라게 했다.
마이어는 수려한 외모에 여유로운 진행, 탄탄한 인맥과 미술에 대한 안목으로 이 시대 최고의 경매사로 군림하고 있다.
반대로 크리스티는 불과 몇 년 전까지 60대 중후한 이미지의 크리스토퍼 버지가 메이저 경매를 이끌었다. 소더비가 젊음과 매력을 내세웠다면 크리스티는 신뢰와 안정감으로 맞선 격이다.
최근 크리스티는 247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는 한편 소더비는 마이어의 퇴진까지 겹치며 불운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 간판 경매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40~60대 남성이자 고위 경영진이라는 점, 그리고 브리티시 악센트를 구사한다는 점이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미술품 경매장 특성상 신뢰와 권위를 얻기 위한 포석.
핀란드 출신인 유시 필가넨은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후 런던 크리스티인스티튜트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1986년 크리스티에 입사해 1997년부터 경매를 진행했다. 크리스티 유럽부문 사장이자 인상주의와 모던아트 회장인 그는 버지 뒤를 이어 뉴욕과 런던 메이저 이브닝 경매를 도맡아 한다. 그는 "경매는 작품과 이벤트를 파는 것이다.
60초 안에 손님에게 영감을 줘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스타 경매사들이 영국식 영어를 쓰는 것은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원래 런던에서 출발한 경매업체이기 때문이다. 전통과 역사, 권위를 중시하는 슈퍼리치들의 취향과도 맞물려 있다.
[이향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02713